| J Mult Scler Neuroimmunol > Volume 16(1); 2025 > Article |
|
ABSTRACT
As the use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CIs) continues to rise, particularly in combination therapies, neurological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irAE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prevalent in clinical practice. These neurological irAEs are rare but often present with atypical and multifocal manifestations, potentially leading to severe neurological impairments or even mortality. Treatment generally involves discontinuation of ICIs, along with corticosteroids, intravenous immunoglobulin, and/or plasma exchange. Effective management requires early diagnosis and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this en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eurological irAEs by clinicians is essential, and this review describes key considerations for the accura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neurological irAEs.
ņĄ£ĻĘ╝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ļŖö ņŚ¼ļ¤¼ ņ¦äĒ¢ēņä▒ ņĢģņä▒ ņóģņ¢æ ĒÖśņ×ÉņØś ņĀäņ▓┤ ņāØņĪ┤ņ£©(overall survival)ņØä Ļ░£ņäĀĒ¢łļŗż.1-7 ņØ┤ļ¤¼ĒĢ£ ņĢĮļ¼╝ļōżņØĆ ļ®┤ņŚŁņ¢ĄņĀ£ ņŗĀĒśĖņØĖ cytotoxic T-lymphocyte associated protein 4 (CTLA-4),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PD-1)Ļ│╝ programmed cell death ligand 1 Ēś╣ņØĆ lymphocyte activation gene 3 ļō▒ņØä ņ░©ļŗ©ĒĢ©ņ£╝ļĪ£ņŹ© ĒĢŁņóģņ¢æ ļ®┤ņŚŁ ļ░śņØæņØä ņ£ĀļÅäĒĢ£ļŗż.8 ļ░£Ēæ£ļÉ£ ņ×äņāü ņŗ£ĒŚś ļō▒ņŚÉ ļö░ļź┤ļ®┤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ļ░£ņāØļźĀņØĆ ļé«ņ¦Ćļ¦ī ņŗ¼Ļ░üĒĢ£ ņןņĢĀļź╝ ņ£Āļ░£ĒĢśĻ▒░ļéś ņé¼ļ¦ØņŚÉ ņØ┤ļź┤Ļ▓ī ĒĢĀ ņłś ņ׳ļŗż.9-12 ņĄ£ĻĘ╝ 50ņŚ¼ Ļ░£ņØś ņ×äņāü ņŗ£ĒŚśņØä Ļ▓ĆĒåĀĒĢ£ Ļ▓░Ļ│╝ ņ┤Ø 9,200ņŚ¼ ļ¬ģņØś ĒÖśņ×É ņżæ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ņĀäņ▓┤ ļ░£ņāØļźĀņØĆ ĒĢŁ-CTLA-4 ņ╣śļŻīļź╝ ļ░øņØĆ ĒÖśņ×ÉņŚÉņä£ 3.8%, ĒĢŁ-PD-1 ņ╣śļŻīļź╝ ļ░øņØĆ ĒÖśņ×ÉņŚÉņä£ 6.1%, ĻĘĖļ”¼Ļ│Ā ĒĢŁ-CTLA-4+PD-1 ļ│ĄĒĢ®ņÜöļ▓ĢņØä ļ░øņØĆ ĒÖśņ×ÉņŚÉņä£ 12%ļĪ£ ļ│ĄĒĢ®ņÜöļ▓ĢņØä ļ░øņØĆ ĒÖśņ×ÉņŚÉņä£ ļŹö ļåÆņØĆ ļ╣łļÅäļĪ£ ļ░£ņāØĒ¢łļŗż.13 ļīĆļČĆļČäņØĆ 1ļō▒ĻĖē ļśÉļŖö 2ļō▒ĻĖēņØś ņŗ¼Ļ░üļÅäļĪ£ ļæÉĒåĄĻ│╝ Ļ░ÖņØĆ ļ╣äĒŖ╣ņØ┤ņĀü ņ”Øņāüņ£╝ļĪ£ ļéśĒāĆļé¼ļŗż. 3-5ļō▒ĻĖēņ£╝ļĪ£ ņĀĢņØśļÉśļŖö ņŗ¼Ļ░üĒĢ£ ļÅģņä▒ņØĆ ĒĢŁ-CTLA-4 ņ╣śļŻīļź╝ ļ░øņØĆ ĒÖśņ×ÉņŚÉņä£ 0.7%, ĒĢŁ-PD-1 ņ╣śļŻīļź╝ ļ░øņØĆ ĒÖśņ×ÉņŚÉņä£ 0.4%, ĻĘĖļ”¼Ļ│Ā ļ│ĄĒĢ®ĒĢŁ-CTLA-4+PD-1 ņ╣śļŻīļź╝ ļ░øņØĆ ĒÖśņ×ÉņŚÉņä£ 0.7%ļĪ£ ļ░£ņāØĒ¢łļŗż. ļŗżļźĖ ļ│┤Ļ│ĀņŚÉņä£ļÅä 3-4ļō▒ĻĖē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 ĒÖśņ×ÉņØś 1% ļ»Ėļ¦īņŚÉņä£ ļ░£ņāØĒĢ£ļŗżĻ│Ā ļ│┤Ļ│ĀļÉśņŚłļŗż.2,3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Ć ņŚ¼ļ¤¼ ņØ┤ņ£ĀļĪ£ ņ¦äļŗ©ņØ┤ ņ¢┤ļĀżņÜĖ ņłś ņ׳ļŗż.13 ņÜ░ņäĀ ļ¦ÄņØĆ ĒÖśņ×ÉļōżņØ┤ Ēö╝ļĪ£, ņĀäņŗĀ ņćĀņĢĮ, ļśÉļŖö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Ļ│╝ ņ£Āņé¼ĒĢ£ ĻĖ░ĒāĆ ņĢö ņŚ░Ļ┤Ć ņ”ØņāüņØä Ļ▓¬ļŖöļŗż. ļŗżņØīņ£╝ļĪ£ ĒĢŁņĢö ņŚ░Ļ┤Ć ļČĆņ×æņÜ®Ļ│╝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ä ĻĄ¼ļČäĒĢśļŖö Ļ▓āņŚÉļÅä ņ¢┤ļĀżņøĆņØ┤ ņ׳ņØä ņłś ņ׳ļŗż. ļśÉĒĢ£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ņ×äņāü ņ¢æņāüĻ│╝ ņ╣śļŻī ļ░śņØæņØ┤ ļ╣äņĀäĒśĢņĀüņØ╝ ņłś ņ׳ņ¢┤ ņ¦äļŗ©Ļ│╝ Ļ┤Ćļ”¼ņŚÉ ņ¢┤ļĀżņøĆņØä Ļ▓¬ņØä ņłś ņ׳ļŗż. ļö░ļØ╝ņä£ ļ®┤ļ░ĆĒĢ£ ĒÖśņ×ÉņØś ļ│æļĀź ņ▓ŁņĘ©, ņŗĀņ▓┤ Ļ▓Ćņé¼ ļ░Å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ŚÉ ļīĆĒĢ£ ĒżĻ┤äņĀü ņØ┤ĒĢ┤Ļ░Ć ņäĀĒ¢ēļÉśņ¢┤ņĢ╝ ĒĢ£ļŗż. ņØ┤ļ▓ł ņóģņäżņŚÉņä£ļŖö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ņĀĢĒÖĢĒĢ£ ņ¦äļŗ© ļ░Å ņ╣śļŻīļź╝ ņ£äĒĢ┤ ņ£ĀņØśĒĢĀ ņĀÉņŚÉ ļīĆĒĢ┤ ļģ╝ĒĢśĻ│Āņ×É ĒĢ£ļŗż.
ņĀĢĒÖĢĒĢ£ ņ¦äļŗ©ņØä ņ£äĒĢ┤ņä£ļŖö ĻĖ░ņĪ┤ņŚÉ Ļ░Ćņ¦ä ĒÄĖļæÉĒåĄņØ┤ļéś ņ£ĀņĀäņä▒ ĻĘ╝ņ£Ī ņ¦łĒÖśĻ│╝ Ļ░ÖņØĆ ļŗżļźĖ ņ¦łļ│æņŚÉ ļīĆĒĢ£ ņØĖņŗØņØä Ļ░Ćņ¦ĆĻ│Ā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ļĪ£ ņØĖĒĢ£ ņāłļĪ£ņÜ┤ ņ”ØņāüņØś ĒÅēĻ░Ćļź╝ ņŗ£Ē¢ēĒĢśļŖö Ļ▓āņØ┤ ĒĢäņÜöĒĢśļŗ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Ēł¼ņĢĮ ņŗ£ņ×æ ņŗ£ ĻĖ░ņĀĆ ĻĘ╝ņ£Ī ĒÜ©ņåī Ēü¼ļĀłņĢäĒŗ┤ ĒéżļéśņĢäņĀ£(creatine kinase) ņłśņ╣ś, Ļ░æņāüņäĀ ĻĖ░ļŖź Ļ▓Ćņé¼ Ļ▓░Ļ│╝ ļō▒ņØä ņŗ£Ē¢ēĒĢśņŚ¼ ĒÖĢņØĖĒĢśļŖö Ļ▓ā ņŚŁņŗ£ ļÅäņøĆņØ┤ ļÉĀ ņłś ņ׳ļŗż.14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ļ▓öņ£äļŖö ļäōņ£╝ļ®░ ņżæņČöņŗĀĻ▓ĮĻ│äņÖĆ ļ¦Éņ┤łņŗĀĻ▓ĮĻ│äņŚÉ ņśüĒ¢źņØä ļ»Ėņ╣śļŖö ņןņĢĀļź╝ ļ¬©ļæÉ ĒżĒĢ©ĒĢĀ ņłś ņ׳ļŗż. ļ¦Éņ┤łņŗĀĻ▓ĮĻ│äņŚÉ ņśüĒ¢źņØä ļ»Ėņ╣śļŖö ņןņĢĀņØś ļ╣łļÅäĻ░Ć ņāüļīĆņĀüņ£╝ļĪ£ ļŹö ļåÆņĢä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2/3 ņĀĢļÅäļź╝ ņ░©ņ¦ĆĒĢśļŖö Ļ▓āņ£╝ļĪ£ ļ│┤Ļ│ĀļÉśĻ│Ā ņ׳ņ£╝ļ®░ ņżæņČöņŗĀĻ▓ĮĻ│ä ņןņĢĀļŖö 1/3 ņĀĢļÅäļĪ£ ļ│┤Ļ│ĀļÉśĻ│Ā ņ׳ļŗż.8 ļ¦Éņ┤łņŗĀĻ▓ĮĻ│ä ņןņĢĀ ņżæ ļ╣łļÅäĻ░Ć Ļ░Ćņן ļåÆņØĆ Ļ▓āņØĆ ĻĘ╝ņ£ĪņŚ╝ņØ┤ļ®░ ņżæņ”ØĻĘ╝ļ¼┤ļĀźņ”ØĻ│╝ ņżæļ│ĄļÉśņ¢┤ ļ░£ņāØĒĢĀ ņłś ņ׳Ļ│Ā ĻĖĖļף-ļ░öļĀłņ”ØĒøäĻĄ░ņØä ĒżĒĢ©ĒĢśļŖö ļŗżļ░£ņä▒ņŗĀĻ▓ĮĻĘ╝ņŗĀĻ▓Įļ│æņ”Ø(polyradiculoneuropathy)Ļ│╝ ļćīņŗĀĻ▓Įļ│æņ”ØņØ┤ ĻĘĖļŗżņØīņ£╝ļĪ£ ĒØöĒĢśļŗż. ņżæņČöņŗĀĻ▓ĮĻ│ä ņןņĢĀļŖö ļćīņŚ╝, ļćīņłśļ¦ēņŚ╝, ņ▓ÖņłśņŚ╝ ļō▒ ļŗżņ¢æĒĢ£ ņ×äņāü ņ¢æņāüņØä ļ│┤ņØ╝ ņłś ņ׳ļŗż.8 ņØ┤ļ¤¼ĒĢ£ ļŗżņ¢æĒĢ£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Ļ┤ĆļĀ© ņŗĀĻ▓ĮĒĢÖņĀü ļČĆņ×æņÜ®ņØś ņ×äņāü ņ¢æņāüņØ┤ Table 1ņŚÉ ņĀĢļ”¼ļÉśņ¢┤ ņ׳ļŗż.15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ļģĖņČ£ Ēøä ņāłļĪ£ņÜ┤ Ļ░ÉĻ░ü, ņÜ┤ļÅÖ, ļśÉļŖö ĻĖ░ĒāĆ ņŗĀĻ▓ĮĒĢÖņĀü ņØ┤ņāüņØ┤ ļ░£ņāØĒĢ£ ĒÖśņ×ÉņŚÉĻ▓īļŖö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ä ņØśņŗ¼ĒĢ┤ņĢ╝ ĒĢ£ļŗż. ņ”ØņāüņØĆ ņØ╝ļ░śņĀüņ£╝ļĪ£ ņ╣śļŻī ņŗ£ņ×æ Ēøä 3Ļ░£ņøö ņØ┤ļé┤ņŚÉ ļéśĒāĆļéśļ®░ ļ│┤Ļ│ĀļÉ£ ņ”Øņāü ļ░£ĒśäņØś ņżæņĢÖĻ░ÆņØĆ 6ņŻ╝ņØ┤ļéś ĻĘĖ ļ▓öņ£äļŖö ņāüļŗ╣Ē׳ ļäōļŗż.16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Ć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ļŗ©ņØ╝ Ēł¼ņĢĮ ĒøäņŚÉļÅä ļ│┤Ļ│ĀļÉśņŚłņ£╝ļ®░ ņ╣śļŻī ņŗ£ņ×æ Ēøä 68ņŻ╝ņŚÉ ļ░£ņāØĒĢ£ ņé¼ļĪĆļÅä ņ׳ņŚłļŗż.10-12,16,17 ņŗĀĻ▓ĮĒĢÖņĀü ņ”ØņāüņØĆ ņ▓┤Ļ│äņĀüņØĖ ņŗĀĻ▓ĮĒĢÖņĀü Ļ▓Ćņ¦äņØä ĒåĄĒĢ┤ Ļ▓ĆĒåĀļÉśņ¢┤ņĢ╝ ĒĢ£ļŗż. ņĀĢĻĖ░ņĀüņ£╝ļĪ£ ĒÖśņ×ÉņŚÉĻ▓ī ĻĘ╝ņ£ĪĒåĄ ņ£Āļ¼┤ņŚÉ ļīĆĒĢ┤ ļ¼Ėņ¦äĒĢśļŖö Ļ▓āņØ┤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Ę╝ņ£ĪņŚ╝ ņ¦äļŗ©ņŚÉ ļÅäņøĆņØ┤ ļÉĀ ņłś ņ׳ļŗż.13 ļśÉĒĢ£ ļćīņŗĀĻ▓ĮņŚÉ ļīĆĒĢ£ Ļ▓ĆĒåĀĻ░Ć ĒĢäņÜöĒĢśļ®░ ņĢłļ®┤ļ¦łļ╣ä, ņ▓ŁĻ░ü ņØ┤ņāü ļō▒ņŚÉ ļīĆĒĢ£ ĒÖĢņØĖņØ┤ ĻČīĻ│ĀļÉ£ļŗż.8 ņ×Éņ£©ņŗĀĻ▓ĮĻ│ä ņ╣©ļ▓öņŚÉ ļīĆĒĢ£ Ļ▓ĆĒåĀļÅä ĒżĒĢ©ļÉśņ¢┤ņĢ╝ ĒĢśļ®░ ļ░£ĒĢ£ ĻĖ░ļŖź ņןņĢĀ, ĻĖ░ļ”Įņä▒ ņĀĆĒśłņĢĢ, ņ£äļ¦łļ╣ä ņ”ØņāüņŚÉ ļīĆĒĢ£ ĒÖĢņØĖņØ┤ ļÅäņøĆņØ┤ ļÉĀ ņłś ņ׳ļŗż.13 ļ¦łņ¦Ćļ¦ēņ£╝ļĪ£ ļæÉĒåĄ, ļ│┤Ē¢ē ļśÉļŖö ņØĖņ¦Ć ĻĖ░ļŖź ņןņĢĀņŚÉ ļīĆĒĢ┤ ĻĄ¼ņ▓┤ņĀüņ£╝ļĪ£ ņ¦łļ¼ĖĒĢĀ Ļ▓āņØ┤ ĻČīņןļÉ£ļŗż.13
ņØśņŗ¼ļÉśļŖö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ŚÉ ļīĆĒĢ£ ņ▓ĀņĀĆĒĢ£ Ļ▓Ćņ¦äņØä ĒåĄĒĢ┤ Ļ░ÉņŚ╝, ĻĖ░ņĀĆ ņĢöņØś ņ¦äĒ¢ē(ņŚ░ņłśļ¦ē ļśÉļŖö ļćīņŗżņ¦ł ņĀäņØ┤), ļČĆņóģņ¢æņ”ØĒøäĻĄ░, ļśÉļŖö ļīĆņé¼ ņØ┤ņāüĻ│╝ Ļ░ÖņØĆ ļŗżļźĖ ņ×Āņ×¼ņĀü ņøÉņØĖņŚÉ ļīĆĒĢ£ ļ░░ņĀ£ļź╝ ņŗ£Ē¢ēĒĢ┤ņĢ╝ ĒĢ£ļŗż.13 ņ▓ĀņĀĆĒĢ£ ļ░░ņĀ£ ņ¦äļŗ© ņØ┤ĒøäņŚÉļŖö ĒÖśņ×ÉņØś ņ”ØņāüņŚÉ ļ¦×ņČöņ¢┤ ņŗżĒŚśņŗż Ļ▓Ćņé¼, ņśüņāü Ļ▓Ćņé¼ ļ░Å ņĀäĻĖ░ ņ¦äļŗ©ņØśĒĢÖņĀü Ļ▓Ćņé¼ ļō▒ņØä ņŗ£Ē¢ēĒĢ£ļŗż. ņŗĀĻ▓ĮņĀäļÅä ļ░Å ĻĘ╝ņĀäļÅä Ļ▓Ćņé¼ļŖö ņØ╝ļ░śņĀüņ£╝ļĪ£ ļ¦Éņ┤łņŗĀĻ▓ĮĻ│ä ņןņĢĀļź╝ ĒÅēĻ░ĆĒĢśĻĖ░ ņ£äĒĢ┤ ņŗ£Ē¢ēĒĢ£ļŗż. ĻĘ╝ļ│æņ”ØĻ│╝ ĻĘ╝ņ£ĪņŚ╝ņØ┤ ņØśņŗ¼ļÉśļéś ņĀäĻĖ░ ņ¦äļŗ©ņØśĒĢÖņĀü ĒÅēĻ░Ć Ļ▓░Ļ│╝Ļ░Ć ļ¬ģĒÖĢņ╣ś ņĢŖņØä ļĢī ĻĘ╝ņ£ĪņØś ņāØĻ▓Ć Ēś╣ņØĆ ĻĘ╝ņ£Ī ņ×ÉĻĖ░Ļ│Ąļ¬ģņśüņāü ņ┤¼ņśü ļō▒ ņČöĻ░Ć Ļ▓Ćņé¼ļź╝ Ļ│ĀļĀżĒĢ┤ņĢ╝ ĒĢĀ ņłś ņ׳ļŗż.8,13 ņŗĀĻ▓Į ņāØĻ▓ĆņØĆ ņØ╝ļ░śņĀüņ£╝ļĪ£ļŖö Ļ│ĀļĀżĒĢśņ¦Ć ņĢŖņ£╝ļéś ņŗĀĻ▓Į ņŚ╝ņ”ØņØä ņóģņ¢æņØś ņ¦üņĀæ ņ╣©ņ£żĻ│╝ ĻĄ¼ļ│äĒĢśĻĖ░ ņ¢┤ļĀĄĻ▒░ļéś ĒśłĻ┤ĆņŚ╝ņä▒ ņŗĀĻ▓Įļ│æņ”ØņØ┤ ņØśņŗ¼ļÉśļŖö Ļ▓ĮņÜ░ Ļ│ĀļĀżĒĢĀ ņłś ņ׳ļŗż.13 ņÜöņČö ņ▓£ņ×ÉļŖö ņżæņČö ļ░Å ļ¦Éņ┤ł ņןņĢĀļź╝ ĒÅēĻ░ĆĒĢśĻĖ░ ņ£äĒĢ┤ ĒØöĒ׳ ņŗ£Ē¢ēļÉśļ®░ ņØ╝ļ░śņĀüņØĖ Ļ▓Ćņé¼ ņÖĖņŚÉļÅä ņĢöņØś ņ¦äĒ¢ēĻ│╝ņØś Ļ░Éļ│äņØä ņ£äĒĢ┤ ļćīņ▓ÖņłśņĢĪņŚÉ ļīĆĒĢ£ ņäĖĒżĒĢÖ Ļ▓Ćņé¼ ļ░Å ņ£ĀņäĖĒż ļČäņäØņØä ĒżĒĢ©ĒĢśļŖö Ļ▓āņØ┤ ļÅäņøĆņØ┤ ļÉĀ ņłś ņ׳ļŗż.8,13 ļśÉĒĢ£ ļŗżļ░£ņä▒ņ£╝ļĪ£ ņ”ØņāüņØ┤ ļéśĒāĆļéĀ ņłś ņ׳ļŗżļŖö Ļ▓āņØä ņØĖņ¦ĆĒĢśļŖö Ļ▓āņØ┤ ņżæņÜöĒĢ£ļŹ░ ņĄ£ĻĘ╝ ļ│┤Ļ│ĀļÉ£ ļé┤ņÜ®ņŚÉ ļö░ļź┤ļ®┤ ņżæņ”Ø ĻĘ╝ļ¼┤ļĀźņ”Ø ĒÖśņ×ÉņØś 30%Ļ░Ć ļÅÖļ░śļÉ£ ĻĘ╝ņ£ĪņŚ╝ņØä, 25%Ļ░Ć ļÅÖļ░śļÉ£ ņŗ¼ĻĘ╝ņŚ╝ņØä ļ│┤ņśĆļŗż.17
ņ╣śļŻīņ¦Ćņ╣©ņØś ĻĖ░ņżĆņØ┤ ļÉśļŖö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ļō▒ĻĖē ļČäļźś ĻĖ░ņżĆņØĆ ļČĆņ×æņÜ® Ļ│ĄĒåĄ ņÜ®ņ¢┤ ĻĖ░ņżĆ(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ņŚÉņä£ ņĀ£ņŗ£ļÉ£ ļ░öļź╝ ļö░ļźĖļŗż(Table 2).18 Ļ▓Įļ»ĖĒĢ£ ļČĆņ×æņÜ®ņØĆ 1-2ļō▒ĻĖē, ņżæņ”ØņØĆ 3-4ļō▒ĻĖē, ņé¼ļ¦ØņØĆ 5ļō▒ĻĖēņ£╝ļĪ£ ļČäļźśĒĢ£ļŗż. 1ļō▒ĻĖēņØĆ Ļ▓Įņ”Øņ£╝ļĪ£ ļ¼┤ņ”Øņāü Ēś╣ņØĆ Ļ▓Įļ»ĖĒĢ£ ņ”ØņāüņØ┤ ņ׳Ļ│Ā ņĪ░ņ╣śĻ░Ć ĒĢäņÜöĒĢśņ¦Ć ņĢŖņØĆ Ļ▓ĮņÜ░ņØ┤Ļ│Ā, 2ļō▒ĻĖēņØĆ ņżæļō▒ļÅäļĪ£ ĻĄŁņåīņĀü ļśÉļŖö ļ╣äņ╣©ņŖĄņĀü ņĪ░ņ╣śĻ░Ć ĒĢäņÜöĒĢśļ®░ ņŚ░ļĀ╣ņŚÉ ņĀüĒĢ®ĒĢ£ ļÅäĻĄ¼ņĀü ņØ╝ņāüņāØĒÖ£ ĒÖ£ļÅÖņØ┤ ņĀ£ĒĢ£ļÉĀ ļĢīļź╝ ņØ╝ņ╗½ļŖöļŗż. 3ļō▒ĻĖēņØĆ ņżæņ”Ø ļśÉļŖö ņØśĒĢÖņĀüņ£╝ļĪ£ ņżæņÜöĒĢśņ¦Ćļ¦ī ņ”ēņŗ£ ņāØļ¬ģņØä ņ£äĒśæĒĢśņ¦ĆļŖö ņĢŖĻ│Ā ņ×ģņøÉņØ┤ ĒĢäņÜöĒĢśļ®░ ņןņĢĀļź╝ ņ£Āļ░£ĒĢśĻ│Ā ņ×ÉĻ░Ć Ļ┤Ćļ”¼ ņØ╝ņāüņāØĒÖ£ ĒÖ£ļÅÖņØ┤ ņĀ£ĒĢ£ļÉśļŖö Ļ▓ĮņÜ░ņØ┤ļ®░, 4ļō▒ĻĖēņØĆ ņāØļ¬ģņØä ņ£äĒśæĒĢĀ ņłś ņ׳Ļ│Ā ĻĖ┤ĻĖē ņĪ░ņ╣śĻ░Ć ĒĢäņÜöĒĢ£ Ļ▓ĮņÜ░ņØ┤ļŗż. ļČĆņ×æņÜ® Ļ│ĄĒåĄ ņÜ®ņ¢┤ ĻĖ░ņżĆņØĆ ļ®┤ņŚŁņÜöļ▓Ģ ņØ┤ņĀäņŚÉ Ļ░£ļ░£ļÉśņŚłĻĖ░ ļĢīļ¼ĖņŚÉ ņØ┤ļ¤¼ĒĢ£ ļÅģņä▒ļōżņØ┤ ĻĖēņåŹĒ׳ ņ¦äĒ¢ēļÉĀ ņłś ņ׳ļŖö ĒŖ╣ņä▒ņ£╝ļĪ£ ņØĖĒĢ┤ ĒÖśņ×ÉņŚÉĻ▓ī ļ»Ėņ╣śļŖö ņ£äĒśæņØä ņČ®ļČäĒ׳ ļ░śņśüĒĢśņ¦Ć ļ¬╗ĒĢĀ ņłś ņ׳Ļ│Ā ĻĄŁņåīņĀüņØ┤ņ¦Ćļ¦ī ņŗ¼Ļ░üĒĢ£ ņĢģĒÖöļź╝ Ēæ£ĒśäĒĢśņ¦Ć ļ¬╗ĒĢĀ ņłś ņ׳ļŗżļŖö ĒĢ£Ļ│äĻ░Ć ņ׳ņ¢┤ Ē¢źĒøä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ŚÉ ĒŖ╣ĒÖöļÉ£ ļō▒ĻĖē ļČäļźś ĻĖ░ņżĆņŚÉ ļīĆĒĢ£ ņŚ░ĻĄ¼Ļ░Ć ĒĢäņÜöĒĢśĻĖ░ļŖö ĒĢśļéś ņĢäņ¦üĻ╣īņ¦ĆļŖö ņ×äņāüņŚÉņä£ ņé¼ņÜ®ļÉśĻ│Ā ņ׳ļŗż.19
ļČĆņ×æņÜ® ļō▒ĻĖēņŚÉ ļö░ļØ╝ ĻČīĻ│ĀļÉśļŖö ņäĖļČĆņĀüņØĖ ņ╣śļŻī ĻČīĻ│Ā ņé¼ĒĢŁņØĆ Table 2ņŚÉ ņĀĢļ”¼ļÉśņ¢┤ ņ׳ļŗż.13,14,18,20,21 ņä▒Ļ│ĄņĀüņØĖ ņ╣śļŻīļź╝ ņ£äĒĢ┤ņä£ļŖö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ņāüĒā£ļź╝ ņØĖņŗØĒĢ£ Ēøä ņżæļō▒ļÅä(2ļō▒ĻĖē) ņØ┤ņāüņØś ņŗ¼Ļ░üļÅäļź╝ ļ│┤ņØ┤ļŖö Ļ▓Įņ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ļź╝ ņżæļŗ©ĒĢśļŖö Ļ▓āņØ┤ ņżæņÜöĒĢśļŗż.20,21 Ēśäņ×¼Ļ╣īņ¦Ć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żæļŗ©ļ¦īņØś ņ╣śļŻī ĒÜ©Ļ│╝ļź╝ ļéśĒāĆļé┤ļŖö ļīĆĻĘ£ļ¬© ņŚ░ĻĄ¼ļŖö ļ│┤Ļ│ĀļÉśņ¦Ć ņĢŖņĢśļŗż. ņ”ØņāüņØ┤ ļ¦żņÜ░ Ļ▓Įļ»ĖĒĢ£ Ļ▓ĮņÜ░(1ļō▒ĻĖē)ļź╝ ņĀ£ņÖĖĒĢśĻ│Ā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 ņ¦äļŗ© ņŗ£ ņĮöļź┤Ēŗ░ņĮöņŖżĒģīļĪ£ņØ┤ļō£ Ēł¼ņĢĮņØ┤ ĻČīĻ│Ā ļÉ£ļŗż.20,21 ņØ╝ļ░śņĀüņ£╝ļĪ£ 1-2ļō▒ĻĖē ņ¦łĒÖśņŚÉļŖö Ļ▓ĮĻĄ¼ ņŖżĒģīļĪ£ņØ┤ļō£(prednisone 0.5-1 mg/kg/day)ļź╝ Ēł¼ņĢĮĒĢśĻ│Ā 3-4ļō▒ĻĖēņŚÉņä£ļŖö methylprednisolone 1-2 mg/kgņØä Ēł¼ņĢĮĒĢśĻ▒░ļéś ņ”ØņāüņØ┤ ņŗ¼Ļ░üĒĢśĻ│Ā ņ¦äĒ¢ēĒĢśļŖö Ļ▓ĮņÜ░ ņĀĢļ¦ź ņŻ╝ņé¼ ņŖżĒģīļĪ£ņØ┤ļō£(methylprednisolone 1 g/day 3-5ņØ╝Ļ░ä) Ēł¼ņĢĮņØä ņŗ£Ē¢ēĒĢ£ļŗż.10,16,20,21 3ļō▒ĻĖē ņØ┤ņāüņØś ņżæņ”Ø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ŚÉņä£ļŖö ņé¼ļĪĆļ│äļĪ£ ņŖżĒģīļĪ£ņØ┤ļō£ņÖĆ ĒĢ©Ļ╗ś ņĀĢļ¦ź ļ®┤ņŚŁĻĖĆļĪ£ļČłļ”░(5ņØ╝ņŚÉ Ļ▒Ėņ│É 2 g/kg ņĀĢļ¦ź ņŻ╝ņé¼) ļśÉļŖö Ēśłņן ĻĄÉĒÖśņłĀ ņ╣śļŻīļź╝ ņŗ£Ē¢ēĒĢ£ļŗż.21 ņØ╝ļČĆ ĒÖśņ×ÉļŖö ņŖżĒģīļĪ£ņØ┤ļō£ Ļ░Éļ¤ēņØ┤ ņ¢┤ļĀżņÜ┤ Ļ▓ĮņÜ░ ņŖżĒģīļĪ£ņØ┤ļō£ ņÜ®ļ¤ēņØä ņĄ£ņåīĒÖöĒĢśĻĖ░ ņ£äĒĢ£ ļ®┤ņŚŁņ¢ĄņĀ£ņĀ£ļź╝ Ļ│ĀļĀżĒĢśļéś ņØ┤ļ¤¼ĒĢ£ ņ╣śļŻī ņäĀĒāØņØś ĻĘ╝Ļ▒░ļŖö ņĢäņ¦ü ņŚ░ĻĄ¼Ļ░Ć ļČĆņĪ▒ĒĢśņŚ¼ ņé¼ļĪĆļ│ä Ļ│ĀļĀżĻ░Ć ĒĢäņÜöĒĢśļŗż.21 ļīĆņĢł ņżæ ĒĢśļéśļĪ£ ļ”¼ĒłŁņŗ£ļ¦ÖņØ┤ ņĀ£ņĢłļÉśĻ│Ā ņ׳ļŖöļŹ░ ņØ┤ļŖö 2ņ░©ņĀüņ£╝ļĪ£ TņäĖĒżļź╝ ļ╣äĒÖ£ņä▒ĒÖöņŗ£Ēé¼ Ļ░ĆļŖźņä▒ņØ┤ ņ׳Ļ│Ā ņāüļīĆņĀüņ£╝ļĪ£ ļ╣ĀļźĖ ņ×æņÜ® ļ░£Ēśä, ĻĘĖļ”¼Ļ│Ā ņóģņ¢æĒĢÖņĀü ņśłĒøä ņĢģĒÖöņŚÉ ļīĆĒĢ£ ņÜ░ļĀżĻ░Ć ļŹ£ĒĢĀ Ļ░ĆļŖźņä▒ ļĢīļ¼ĖņØ┤ļéś Ē¢źĒøä ņČöĻ░ĆņĀüņØĖ ņŚ░ĻĄ¼Ļ░Ć ĒĢäņÜöĒĢśļŗż.13,22
ņŖżĒģīļĪ£ņØ┤ļō£ņØś ļČĆņ×æņÜ®ņØĆ ņל ņĢīļĀżņĀĖ ņ׳ņ£╝ļ®░ ĻĖ░ļČä ļ│ĆĒÖö, ņ▓┤ņżæ ņ”ØĻ░Ć, Ļ│ĀĒśłļŗ╣, Ļ│ĀĒśłņĢĢ, ņ£äņŚ╝, Ļ│©ļŗżĻ│Ąņ”Ø, ĻĖ░ĒÜīĻ░ÉņŚ╝, Ēö╝ļČĆ ņĘ©ņĢĮņä▒ ļō▒ņØ┤ ļ░£ņāØĒĢĀ ņłś ņ׳ļŗż. Ēć┤ņøÉ ņŗ£ Ļ│ĀņÜ®ļ¤ē ņŖżĒģīļĪ£ņØ┤ļō£ļź╝ Ēł¼ņĢĮĒĢśĻ│Ā ņ׳ļŖö ĒÖśņ×ÉņŚÉĻ▓ī ļ╣äĒāĆļ»╝ D/ņ╣╝ņŖśņĀ£, ņ£ä ļ│┤ĒśĖņĀ£, ļśÉļŖö ņśłļ░®ņĀü ĒĢŁņāØņĀ£ņÜöļ▓Ģ ļō▒ņØś ļ│æņÜ® Ēł¼ņŚ¼ļź╝ Ļ│ĀļĀżĒĢ┤ņĢ╝ ĒĢ£ļŗż.13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ä Ļ░Ćņ¦ä ĒÖśņ×ÉļōżņŚÉņä£ ĻĖĖļף-ļ░öļĀłņ”ØĒøäĻĄ░ņØĆ ĒŖ╣ņĀĢ Ļ│ĀļĀż ņé¼ĒĢŁņØ┤ ņ׳ļŗż. ņŖżĒģīļĪ£ņØ┤ļō£ļŖö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ĖĖļף-ļ░öļĀłņ”ØĒøäĻĄ░ņŚÉņä£ ņĀĢļ¦ź ļ®┤ņŚŁĻĖĆļĪ£ļČłļ”░ ļśÉļŖö ĒśłņןĻĄÉĒÖśņłĀĻ│╝ ĒĢ©Ļ╗ś ņé¼ņÜ®ļÉśļ®░ ņØ┤ļŖö ņØ┤ļ¤¼ĒĢ£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ĖĖļף-ļ░öļĀłņ”ØĒøäĻĄ░ņØ┤ ņØ╝ļ░śņĀüņØĖ ĒŖ╣ļ░£ņä▒ ĻĖĖļף-ļ░öļĀłņ”ØĒøäĻĄ░Ļ│╝ļŖö ļŗ¼ļ”¼ ņŖżĒģīļĪ£ņØ┤ļō£ņŚÉ ļ░śņØæĒĢśĻĖ░ ļĢīļ¼ĖņØ┤ļŗż.21,23 ņØ┤ļ¤¼ĒĢ£ ņśłļŖö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ĻĘ╝ļ│ĖņĀüņØĖ ļ│æĒā£ņāØļ”¼ĒĢÖņØä ĒÖĢņØĖĒĢśĻ│Ā ņĄ£ņĀüņØś ņ╣śļŻīļ▓ĢņØä ļ░ØĒ׳ĻĖ░ ņ£äĒĢ£ ņČöĻ░Ć ņŚ░ĻĄ¼Ļ░Ć ĒĢäņÜöĒĢ©ņØä ļ│┤ņŚ¼ņżĆļŗż. ņŖżĒģīļĪ£ņØ┤ļō£Ļ░Ć ņĢö ņ╣śļŻī Ļ▓░Ļ│╝ņŚÉ ļČĆņĀĢņĀüņØĖ ņśüĒ¢źņØä ļ»Ėņ╣Ā ņłś ņ׳ļŗżļŖö ņØ┤ļĪĀņĀü ņÜ░ļĀżĻ░Ć ņ׳ņ¦Ćļ¦ī ņĀäņ▓┤ ņāØņĪ┤ņ£©Ļ│╝ ņ╣śļŻī ņŗżĒī©Ļ╣īņ¦ĆņØś ņŗ£Ļ░äņØĆ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ņĪ┤ņ×¼ļéś ņĀäņŗĀ ņŖżĒģīļĪ£ņØ┤ļō£ ĒĢäņÜö ņŚ¼ļČĆņŚÉ Ēü░ ņśüĒ¢źņØä ļ░øņ¦Ć ņĢŖļŖö Ļ▓āņ£╝ļĪ£ ļ│┤ņØĖļŗż.24 ĻĘĖļ¤¼ļéś Ļ│ĀņÜ®ļ¤ē ĻĖĆļŻ©ņĮöņĮöļź┤Ēŗ░ņĮöņØ┤ļō£ļĪ£ ņ╣śļŻīļ░øņØĆ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ćīĒĢśņłśņ▓┤ņŚ╝ ĒÖśņ×ÉļŖö ņĀĆņÜ®ļ¤ēņŚÉ ļ╣äĒĢ┤ ņāØņĪ┤ņ£©ņØ┤ Ļ░ÉņåīĒĢ£ļŗżļŖö ņāłļĪ£ņÜ┤ ļ│┤Ļ│ĀļÅä ņ׳ņ¢┤ ņČöĻ░ĆņĀüņØĖ ņŚ░ĻĄ¼Ļ░Ć ĒĢäņÜöĒĢśļŗż.25 Ļ│ĀņÜ®ļ¤ē ĻĖĆļŻ©ņĮöņĮöļź┤Ēŗ░ņĮöņØ┤ļō£Ļ░Ć ņ×Āņ×¼ņĀüņ£╝ļĪ£ ļČĆņĀĢņĀüņØĖ ĒÜ©Ļ│╝ļź╝ Ļ░Ćņ¦ł ņłś ņ׳ņØīņØä Ļ│ĀļĀżĒĢĀ ļĢī Ļ░ĆļŖźĒĢ£ ļé«ņØĆ ņÜ®ļ¤ēņØś ņŖżĒģīļĪ£ņØ┤ļō£ ņé¼ņÜ®ņØä ņŚ╝ļæÉņŚÉ ļæÉņ¢┤ņĢ╝ ĒĢ£ļŗż. ņØ╝ļ░śņĀüņ£╝ļĪ£ ņŖżĒģīļĪ£ņØ┤ļō£ļź╝ ņ”Øņāü ĒśĖņĀä ņŚ¼ļČĆņŚÉ ļö░ļØ╝ ņ▓£ņ▓£Ē׳ Ļ░Éļ¤ēĒĢśļ®░ ĒÖśņ×ÉņŚÉĻ▓ī ņ”Øņāü ņ×¼ļ░£ņØ┤ļéś ņĢģĒÖöĻ░Ć ņ׳ļŖö Ļ▓ĮņÜ░ Ļ░Éļ¤ēņØä ņżæļŗ©ĒĢśĻ│Ā ļŗżņŗ£ ņ”Øļ¤ēĒĢ£ļŗż.13,21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 ĒÖśņ×ÉņŚÉņä£ ņé¼ļ¦Ø ņé¼ļĪĆĻ░Ć ļ│┤Ļ│ĀļÉśņŚłņ¦Ćļ¦ī ļīĆļČĆļČäņØś ĒÖśņ×ÉļŖö ņāüļŗ╣ĒĢ£ ĒÜīļ│ĄņØä ļ│┤ņØĖļŗż.26 ĻĖ░ņĪ┤ ņŚ░ĻĄ¼ņŚÉņä£ ļ│┤Ļ│ĀļÉ£ 27Ļ▒┤ ņżæ 73%ņØś ĒÖśņ×ÉĻ░Ć ļČĆļČäņĀüņØ┤Ļ▒░ļéś ņÖäņĀäĒĢ£ ņŗĀĻ▓ĮĒĢÖņĀü ĒÜīļ│ĄņØä ļ│┤ņśĆņ£╝ļ®░ Ļ░£ņäĀĻ╣īņ¦ĆņØś ņżæņĢÖĻ░ÆņØĆ 4ņŻ╝ņśĆļŗż.14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 ĒŖ╣Ē׳ ļŗżņżæ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ä Ļ▓ĮĒŚśĒĢ£ ĒÖśņ×ÉļŖö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 ņŚåņŚłļŹś ĒÖśņ×ÉņŚÉ ļ╣äĒĢ┤ ņĢöņØś ņ¦äĒ¢ēņØ┤ ņŚåļŖö ņāØņĪ┤ ĻĖ░Ļ░äņØ┤ ļŹö ĻĖĖņŚłļŗżļŖö ļ│┤Ļ│ĀļÅä ņ׳ņŚłļŗż.27 ņŻ╝ļ¬®ĒĢĀ ņĀÉņØĆ ĒÖśņ×ÉĻ░Ć ņ×¼ņ╣śļŻīļź╝ ĒĢäņÜöļĪ£ ĒĢśņ¦Ć ņĢŖņØä ņłśļÅä ņ׳ņ£╝ļ®░ ļŗ©ņČĢļÉ£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Żī Ļ│╝ņĀĢņŚÉļÅä ļ░śņØæņØä ļ│┤ņØ╝ ņłś ņ׳ļŗżļŖö Ļ▓āņØ┤ļŗż.13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ä Ļ▓ĮĒŚśĒĢ£ ĒÖśņ×ÉņŚÉņä£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ļĪ£ ļŗżņŗ£ ņ╣śļŻīĒĢśļŖö Ļ▓āņØä ņŗ£ļÅäĒĢ┤ ļ│╝ ņłś ņ׳ļŗż.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ä Ļ▓¬ņØĆ ĒÖśņ×É ņżæ ĒŖ╣Ē׳ 1ļō▒ĻĖē, 2ļō▒ĻĖē, ļśÉļŖö ļ╣Āļź┤Ļ▓ī ĒĢ┤ņåīļÉ£ 3ļō▒ĻĖēņØś ļČĆņ×æņÜ®ņØä Ļ▓ĮĒŚśĒĢ£ ĒÖśņ×ÉņŚÉĻ▓ī ņ×¼Ēł¼ņĢĮĒĢśļŖö Ļ▓āņØ┤ ĒĢ®ļ”¼ņĀüņØ┤ļ®░ ņØ╝ļ░śņĀüņ£╝ļĪ£ ļŗżļźĖ ņóģļźśņØś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ļĪ£ ņ×¼Ēł¼ņĢĮņØä ņŗ£ļÅäĒĢ£ļŗż.28 ņ╣śļŻī Ļ▓░ņĀĢņØĆ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 Ļ┤Ćļ”¼ņŚÉ ņØĄņłÖĒĢ£ ņŗĀĻ▓ĮĻ│╝ ņĀäļ¼ĖņØśņÖĆ ĒśæļĀźĒĢśņŚ¼ ņØ┤ļŻ©ņ¢┤ņ¦ĆļŖö Ļ▓āņØ┤ ļ░öļ×īņ¦üĒĢśļ®░ Ē¢źĒøä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¼Ēł¼ņĢĮ ĒÖśņ×Éļź╝ ņäĀļ│äĒĢśĻĖ░ ņ£äĒĢ£ ņāØņ▓┤ Ēæ£ņ¦Ćņ×É ļ░Å ņ×¼Ēł¼ņĢĮĒĢ£ ĒÖśņ×ÉļōżņØś ņŗĀĻ▓ĮĒĢÖņĀü Ļ▓░Ļ│╝ņŚÉ ļīĆĒĢ£ ņČöĻ░Ć ņŚ░ĻĄ¼Ļ░Ć ĒĢäņÜöĒĢśļŗż. ņ×¼Ēł¼ņĢĮ Ļ▓░ņĀĢņØ┤ ļé┤ļĀżņ¦Ćļ®┤ ņŗĀņżæĒĢ£ ļ│æļĀź ņĪ░ņé¼, ņŗĀĻ▓ĮĒĢÖņĀü Ļ▓Ćņé¼, ĻĘĖļ”¼Ļ│Ā ĒĢäņÜöĒĢ£ Ļ▓ĮņÜ░ ņŚ░Ļ┤Ć ļ│┤ņĪ░ Ļ▓Ćņé¼ļź╝ ĒåĄĒĢ┤ ņāłļĪ£ņÜ┤ ņŗĀĻ▓ĮĒĢÖņĀü ĻĖ░ņżĆņØś ņäżņĀĢņØ┤ ĒĢäņÜöĒĢśļ®░ ļÅÖņØ╝ĒĢ£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ś ņ×¼ļ░£ ļśÉļŖö ņāłļĪ£ņÜ┤ ļČĆņ×æņÜ®ņØś ļ░£ņāØņØä Ļ░Éņ¦ĆĒĢśĻĖ░ ņ£äĒĢ┤ ņ¦ĆņåŹņĀüņØ┤Ļ│Ā ņĀĢĻĖ░ņĀüņØĖ ĒÅēĻ░ĆĻ░Ć ĻČīņןļÉ£ļŗż.13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Ć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ļź╝ ņé¼ņÜ®ĒĢśļŖö ĒÖśņ×ÉĻ░Ć ņ”ØĻ░ĆĒĢśĻ│Ā ĒŖ╣Ē׳ ļ│ĄĒĢ®ņÜöļ▓ĢņØ┤ ļ¦ÄņØ┤ ņĀüņÜ®ļÉ©ņŚÉ ļö░ļØ╝ ņŗżņĀ£ ņ×äņāüņŚÉņä£ ļŹö ĒØöĒĢ┤ņ¦ł ņłś ņ׳ņØä Ļ▓āņ£╝ļĪ£ ņśłņĖĪļÉ£ļŗż. ņÜöņĢĮĒĢśņ×Éļ®┤ ņ×äņāü ņ¢æņāüņØĆ ļ╣äņĀäĒśĢņĀüņØ┤Ļ│Ā ļŗżļ░£ņä▒ņØ╝ ņłś ņ׳ņ£╝ļ®░ ņןĻĖ░ņĀüņ£╝ļĪ£ ņŗ¼Ļ░üĒĢ£ ņŗĀĻ▓ĮĒĢÖņĀü ņןņĢĀļéś ņé¼ļ¦Øņ£╝ļĪ£ ņØ┤ņ¢┤ņ¦ł ņłś ņ׳ļŗż. ĒÜ©Ļ│╝ņĀüņØĖ Ļ┤Ćļ”¼ļź╝ ņ£äĒĢ┤ņä£ļŖö ņĪ░ĻĖ░ ņ¦äļŗ©Ļ│╝ ņ╣śļŻīņŚÉ ņżæņĀÉņØä ļæö ļŗżĒĢÖņĀ£ņĀü ĒśæļĀźņØ┤ ĒĢäņÜöĒĢśļŗż. ņ╣śļŻīļŖö ņØ╝ļ░śņĀüņ£╝ļĪ£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Ēł¼ņŚ¼ļź╝ ņżæļŗ©ĒĢśĻ│Ā ņŖżĒģīļĪ£ņØ┤ļō£ņÖĆ ļ®┤ņŚŁĻĖĆļĪ£ļČłļ”░ņØ┤ļéś ĒśłņןĻĄÉĒÖśņłĀņØä ļ│æĒ¢ēĒĢśņŚ¼ ņŗ£Ē¢ēĒĢ£ļŗż. ņØ┤ļ¤¼ĒĢ£ ņĀæĻĘ╝ļ▓ĢņØä ĒåĄĒĢ┤ ļīĆļČĆļČäņØś ĒÖśņ×ÉļŖö ņłśņŻ╝ņŚÉņä£ ņłśĻ░£ņøö ļé┤ņŚÉ ņŗĀĻ▓ĮĒĢÖņĀü ņ”ØņāüņØś ņÖäĒÖöļź╝ ļ│┤ņØ┤ļéś ņØ╝ļČĆ ĒÖśņ×ÉļŖö ņĀüĻĘ╣ņĀüņØĖ ņ╣śļŻīņŚÉļÅä ļČłĻĄ¼ĒĢśĻ│Ā ņŗ¼Ļ░üĒĢ£ ņŗĀĻ▓ĮĒĢÖņĀü ņןņĢĀļź╝ Ļ▓ĮĒŚśĒĢĀ ņłś ņ׳ļŗż. ņŗĀĻ▓ĮĒĢÖņĀü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Ś░Ļ┤Ć ļČĆņ×æņÜ®ņØä Ļ▓ĮĒŚśĒĢ£ ņØ╝ļČĆ ņäĀļ│äļÉ£ ĒÖśņ×ÉņŚÉņä£ļŖö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ņ×¼Ēł¼ņĢĮņØä ņŗ£ļÅäĒĢĀ ņłś ņ׳ļŗż.
Table┬Ā1.
ļ®┤ņŚŁĻ┤Ćļ¼Ėņ¢ĄņĀ£ņĀ£ Ļ┤ĆļĀ© ņŗĀĻ▓ĮĒĢÖņĀü ļČĆņ×æņÜ®ņØś ņ×äņāü ņ¢æņāü
Table┬Ā2.
ļČĆņ×æņÜ® ļō▒ĻĖēĻ│╝ ļō▒ĻĖēņŚÉ ļö░ļØ╝ ĻČīĻ│ĀļÉśļŖö ņ╣śļŻī
Ameri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ESMO ĻČīĻ│Ā ĻĖ░ņżĆņØä ļö░ļ”ä.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 ICU, intensive care unit; MGFA, myasthenia gravis foundation of America clinical classification; CK, creatine kinase;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EMG, electromy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e.
REFERENCES
1. Daud A, Ribas A, Robert C, Hodi FS, Wolchok JD, Joshua AM, et al. Long-term efficacy of pembrolizumab (pembro; MK-3475) in a pooled analysis of 655 patients (pts) with advanced melanoma (MEL) enrolled in KEYNOTE-001. J Clin Oncol 2015;33:9005.

2. Hodi FS, OŌĆÖDay SJ, McDermott DF, Weber RW, Sosman JA, Haanen JB, et al. Improved survival with ipilimumab in patients with metastatic melanoma. N Engl J Med 2010;363:711-723.



3. Larkin J, Chiarion-Sileni V, Gonzalez R, Grob JJ, Cowey CL, Lao CD, et al. Combined nivolumab and ipilimumab or monotherapy in untreated melanoma. N Engl J Med 2015;373:23-34.


4. Schadendorf D, Hodi FS, Robert C, Weber JS, Margolin K, Hamid O, et al. Pooled analysis of long-term survival data from phase II and phase III trials of ipilimumab in unresectable or metastatic melanoma. J Clin Oncol 2015;33:1889-1894.



5. Borghaei H, Paz-Ares L, Horn L, Spigel DR, Steins M, Ready NE, et al. Nivolumab versus docetaxel in advanced nonsquamous non-small-cell lung cancer. N Engl J Med 2015;373:1627-1639.


6. Brahmer J, Reckamp KL, Baas P, Crin├▓ L, Eberhardt WE, Poddubskaya E, et al. Nivolumab versus docetaxel in advanced squamous-cell non-small-cell lung cancer. N Engl J Med 2015;373:123-135.



7. Motzer RJ, Escudier B, McDermott DF, George S, Hammers HJ, Srinivas S, et al. Nivolumab versus everolimus in advanced renal-cell carcinoma. N Engl J Med 2015;373:1803-1813.



8. OŌĆÖHare M, Guidon AC. Peripheral nervous system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due to checkpoint inhibition. Nat Rev Neurol 2024;20:509-525.



9. Larkin J, Hodi FS, Wolchok JD. Combined nivolumab and ipilimumab or monotherapy in untreated melanoma. N Engl J Med 2015;373:1270-1271.


10. Spain L, Walls G, Julve M, OŌĆÖMeara K, Schmid T, Kalaitzaki E, et al. Neurotoxicity from immune-checkpoint inhibition in the treatment of melanoma: a single centre experience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nn Oncol 2017;28:377-385.


11. Kao JC, Liao B, Markovic SN, Klein CJ, Naddaf E, Staff NP, et al. Neurological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anti-programmed death 1 (PD-1) antibodies. JAMA Neurol 2017;74:1216-1222.



12. Zimmer L, Goldinger SM, Hofmann L, Loquai C, Ugurel S, Thomas I, et al. Neurological, respiratory, musculoskeletal, cardiac and ocular side-effects of anti-PD-1 therapy. Eur J Cancer 2016;60:210-225.


13. Reynolds KL, Guidon AC.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associated neurologic toxicity: illustrative case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Oncologist 2019;24:435-443.




14. Puzanov I, Diab A, Abdallah K, Bingham CO 3rd, Brogdon C, Dadu R, et al. Managing toxicities associ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consensus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SITC) toxicity management working group. J Immunother Cancer 2017;5:95.


15. Farina A, Villagr├Īn-Garc├Ła M, Vogrig A, Zekeridou A, Mu├▒iz-Castrillo S, Velasco R, et al. Neurological adverse events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nd the development of paraneoplastic neurological syndromes. Lancet Neurol 2024;23:81-94.


16. Cuzzubbo S, Javeri F, Tissier M, Roumi A, Barlog C, Doridam J, et al. Neurological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review of the literature. Eur J Cancer 2017;73:1-8.


17. Suzuki S, Ishikawa N, Konoeda F, Seki N, Fukushima S, Takahashi K, et al. Nivolumab-related myasthenia gravis with myositis and myocarditis in Japan. Neurology 2017;89:1127-1134.


18.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ersion 5.0 [Internet]. Bethesda: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7 [cited 2017 Nov 27]. Available from: https://ctep.cancer.gov/protocoldevelopment/electronic_applications/docs/ctcae_v5_quick_reference_5x7.pdf.
19. Neilan TG, Rothenberg ML, Amiri-Kordestani L, Sullivan RJ, Steingart RM, Gregory W, et al. Myocarditis associ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n expert consensus on data gaps and a call to action. Oncologist 2018;23:874-878.




20. Haanen JBAG, Carbonnel F, Robert C, Kerr KM, Peters S, Larkin J, et al. Management of toxicities from immunotherapy: ESM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diagnosis, treatment and follow-up. Ann Oncol 2017;28:iv119-iv142.


21. Brahmer JR, Lacchetti C, Schneider BJ, Atkins MB, Brassil KJ, Caterino JM, et al. Management of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in patients tre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 therapy: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J Clin Oncol 2018;36:1714-1768.

22. M├®let J, Mulleman D, Goupille P, Ribourtout B, Watier H, Thibault G. Rituximab-induced T cell depletion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ssociation with clinical response. Arthritis Rheum 2013;65:2783-2790.


23. van Koningsveld R, Schmitz PI, Mech├® FG, Visser LH, Meulstee J, van Doorn PA. Effect of methylprednisolone when added to standard treatment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for Guillain-Barr├® syndrome: randomised trial. Lancet 2004;363:192-196.


24. Horvat TZ, Adel NG, Dang TO, Momtaz P, Postow MA, Callahan MK, et al.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need for systemic immunosuppression, and effects on survival and time to treatment failure in patients with melanoma treated with ipilimumab at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J Clin Oncol 2015;33:3193-3198.



25. Faje AT, Lawrence D, Flaherty K, Freedman C, Fadden R, Rubin K, et al. High-dose glucocorticoids for the treatment of ipilimumab-induced hypophysitis is associated with reduced survival in patients with melanoma. Cancer 2018;124:3706-3714.



26. Touat M, Talmasov D, Ricard D, Psimaras D. Neurological toxicities associated with immune-checkpoint inhibitors. Curr Opin Neurol 2017;30:659-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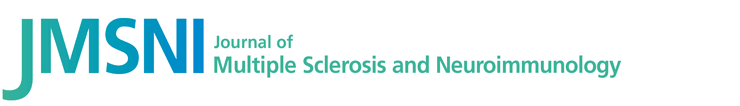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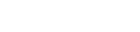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